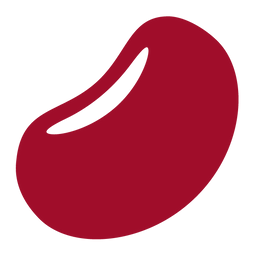너와 섬진강 나루에서 배를 탄 적 있어.
그때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눈동자 속에는
네 힘든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강물이 이토록 맑을 줄이야, 정말 맑다.
-아마도 이른 봄이라 그럴 거야,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금 탁해지겠지.
너와 둘이서만 만났기에
어색했던 까닭이었을까?
너와 둘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너는 뱃머리에서,
나는 배 중간쯤에서 흡사 다툰 사람처럼
서로 그 맑은 강물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뚝뚝하게 말을 건넸었다.
뱃전에 부서지는 물소리.
술에 얼큰한 사공과
그를 따라나선 개 한 마리.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늘어진 배에는 두 줄로 나란히 선
젖꼭지가 선명하던 어미 개.
-잘 살았나?
-그럼, 잘 살지 않고.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공이었지.
술에 취해서 벌건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공이 생각하기엔
우리가 몹시 다투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테지.
화개장터 나루터에서
그렇게 강을 건너서 광양에 갔고,
광양 쪽의 나루터에 내리자
우리는 할 일이 없었어.
우리를 다시 화개로 데려다 달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아니하고
천천히 담배를 피우던 사공.
사공이 담배를 맛있게 피우고
뱃전에 쓰윽 비벼서
끌 때까지 기다리면서
너는 젖이 늘어진
어미 개의 강아지들과 놀고,
난 그 맑고 잔잔한
강을 보던 시간의 짧은 침묵.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그 정적이 얼마나 숨 막혔던지
난 실신해 버릴 것 같았어.
아, 사금파리처럼
가슴을 찌르던 이름 하나.
그 서걱이던 이름 하나.
너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손바닥에
손가락 연필을 만들어서
이름 하나.
무심코 적어 보던 날이었지.
바람 부는
눈밭을 홀로 걷던 그런 날.
세상의 아무것도
내게
위로가 되어 주지 못했던
그런 날에도
가끔 안쓰럽게 불러보던 이름.
애처롭게
따스한 손 내밀어 주던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