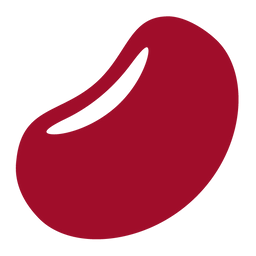내 안에 오래 품어서
거친 언어의 씨들과 버무려서
패랭이나 수레국화 같은
향기로운 이름 하나 얻고 싶었습니다
봄볕 푸르고 바람 눈부신 날
멀리로 가까이로 흩어 놓으며
보내면서 수없이 부탁을 했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오로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간절했던 말도
담담히 뿌려놓을수 있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배회하는
순한 바람의 등을 타고
이들이 다시 언덕으로 돌아오면
젊은 나를 만난 듯 애틋해지고
조금은 호들갑스러워질 것입니다
한 지붕 밑의 삶도 차마 하지 못하는
야무진 약속이기에
우린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
– 송미정, ‘꽃씨를 뿌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