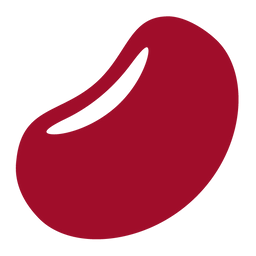만 원짜리 한 장(4)
세상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햇님이 아침 일찍 나와
세상 어두운 곳을 비춰주러
분주히 뛰어다니더니,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며
헐레벌떡 뛰어가다 숨이 찼는지
발개진 햇님이 멀어진
자리에,
둥글둥글한 달님이
교대 근무를 하러 나와 앉은
밤이 오고 있었는데요.
“저, 여기 **병원인데요”
로 시작된 전화를 붙들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응급실 앞에서 난 다시
그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가방 하나를
사이에 둔 노부부가
포근한 봄 달빛을 등에 지고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대리운전 부르셨죠?”
가방을 얼른 받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나에게
노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우리 영감이 허리가 아파
차를 몰고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수술까지 하는 통에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다가
오늘에야 집으로 가게
되었다며,
“아직 덜 완쾌되어
운전할 힘이 없다지 뭐유”
그래서
하는 수없이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햇살에 얼굴을 내민
봄꽃처럼 화사하게
하시는지라
미소를 띠며 듣고 있던
내 귀에 연인들의 밀어처럼
두 분이 속삭이는 말이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영감…,
이제 술도 좀 줄이시고요”
“그려”
“담배도요”
“우리 할멈 시키는 대로
다 할테니 뭐든 말만 혀”
“병원에 며칠 계시더니
철들은 것 같구려”
“임자, 나 때문에 옆에서
병간호한다고 고생했어.”
“알아주니 내가 고맙네요”
그렇게
알콩달콩 주고받는
이야기에 추해 하늘을 날 듯
사뿐히 달려가는 도중
두 분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요.
“영감,
이번에 이 오래된 차도
그만 폐차를 시킵시다.”
“우리 아들이
주고 간 찬데 멈출 때까지
타고 댕겨야지”
“저기 저 둥글 넓적한 달이
우리 아들 민규를 똑 닮았네요.”
두 분은
서로의 차창에 떠 있는
둥근달을 보며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더 큰 슬픔으로
가슴에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눈물이 되어
지난 간 자리를 따라 반지하
주택 앞에 멈춰선 노부부는
조심조심 와줘서 고맙다며
꼬불쳐 놓은 만 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여주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난 건강히 잘 지내시라는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손톱 하나만큼
벌어진 차창 사이로
그 돈은 넣어 둔 채로…,
–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