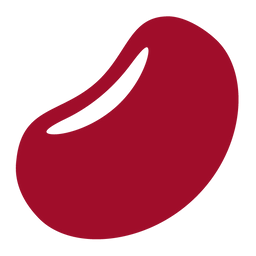만 원짜리 한 장(3)
때는 2023년의 겨울,
하늘 시계가 까만 밤에 묻혀
사라진 자리
노란 달님이
게슴츠레한 눈을 비비며
나와 앉은 버스정류장엔
서둘러 집에 가려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길이
어둠과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요.
하얀 눈을 뜨고 도착한 버스에
흰서리 머리에 고슬고슬 앉은
아주머니 한 분과
금방 직장에서 퇴근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올라서더니
비어 있는 자리에 가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가에 머문 아주머니가
바람 이불 덮고 잠이 든
밤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허기찬 긴 그림자처럼
연신 차창에 머리를 찢어가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젊은 남자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듯
가날픈 시집 한 권을 꺼내
읽고 있는 동안,
버스는
달리다 멈추고
다시 달려나가고 있는
그 틈바구니 사이로
오르고 내리는 발길들은
가득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아…,
분명히 가지고 나왔는데
어딜 갔지…,”
어느새
잠에서 깬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두 개의 가방과
앉은자리 주변을 훑어보며
내뱉는 소리에
젊은 남자도 덩달아
발밑까지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울리는 휴대전화기 벨소리
“아이쿠…,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한참을 찾았네”
(“응애…응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아주머니는 다짐하듯 못다 한
말을 이어가고 잇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걸거니까
걱정말고 얼른 동수
젖부터 줘라”
출산한 딸의
몸조리를 해주고 오는 듯한
아주머니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내 목마른 얼굴로
또 졸고 있는 모습이
까만 도화지가 된 차창에
그려지는 걸
넌지시 바라보고 있던
젊은 남자는 밑둥빠진 세월을
뒤로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자신의 엄마도
그 언젠가
저랬을 모습인 것 같아
아련해진 아픔을 마음 한편에
그려놓더니
쪽잠 든
아주머니 가방 위에
만 원짜리 한 장을 살포시
놓아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하나쯤 빌려와
마중 나온 꼬마 별들과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젊은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갑을
딸집에 놓고 왔다는 걸요…,
–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