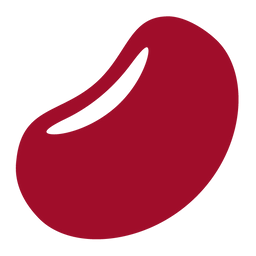만 원짜리 한 장(2)
“면접 결과
아쉽지만 불합격하셨습니다. ”
33번째 불합격 문자를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울리는 벨소리
“이달까지 취직 못하면
고향으로 내려와서 과수원
농사 짓거라”
주름 사이로
성이 덜 찬 아버지의 음성이
비문처럼 그려진 어둠 속에서
남은 날들을 저어갈 용기를
얻기 위해 편의점 앞에
멈춰선 나는,
지갑 안에 홀로 잠들어있는
만 원짜리 한 장을 번갈아 바라보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서
버스 정류장 멈춰 섰을 때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할머니는 인기척에 나를 바라보며
울먹이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울 아들 사골국 끓여주려
시장 보러 나왔다가
버스에서 졸다가 내리는 바람에
지갑을 놓고 내렸지 뭐유”
그말에
지갑에 고이 접어둔
만 원짜리를 꺼내어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이걸루 택시 타고 가세요
할머니.”
“……”
“할머니,
사시는 동네가 어디예요?”
“천수동이유”
“그럼 할머니께서는
114번을 타고 오신 거네요”
먼저 가려는 어둠을 붙들어 놓고
난 어디론가 서둘러 휴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고 잇었다.
“걱기ㅏ 오성여객 맞죠?”
여차저차
사정 이야기를 들은 사무실 직원은
해당버스 기사가 방금 유실물
보관함에 넣고 갔다는 말에
고단함은
달빛에 걸어둔 채
할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루 끝자락에 걸린 눈물을
지울 새도 없이…,
“늙은 나 때문에
괜한 젊은이까지 집에
못가게 하구”
행복과 격리된
한숨의 언어들로
도시가 잠든 길을 따라 도착한
버스 사무실에서
“에구머니나…, 이를 어째”
반지갑만 들고 나온 걸
그제야 기억을 한 할머니에게
“혹 할머니
집전화 기억나세요?”
“그럼, 알다 마다”
기대하는 일마저
지쳐버린 할머니가 가르쳐준
전화번호 너머로 들려오는
중년의 남자 목소리
“저…,
김복순 할머니…,로
시작된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들고 있던 아들은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젊은이 고마워요
어찌 사례를 해야 할지…?”
“아닙니다”
사례를 한다는 걸
한사코 마다하고 돌아온 나는
방에 들어온 달빛을 등불 삼아
이력서에 적힐 나를 찾으려
밤새 뒤적이다 새벽을 개고
일어난 아침.
끝아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아…, 참
죄송해야. 담에 살게요.”
남아 있던 만 원짜리 한 장을
할머니엑 준 걸 그제야 기억이
났던 나는 면접 볼 회사에 갈
차비도 없었기에 아침이 열린
틈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102번 김정민씨?”
“면접번호 102번 김정민입니다.”
“아니…, 젊은이는…?”
봄을 마중 나온 햇살처럼
나를 반기시는 그분은
어제 만난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할머니께서
내개 꼭 돌려주라며 준
만 원짜리 한 장을 내 손에
쥐여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우리 회사에선
자네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네.” 라고…,
– 중에서 –